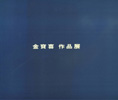2008.04.11 ~ 04.25 갤러리 인 서울 갤러리 인 《Towards》

'두터운 맥락의 친밀성(Context-laden Intimacy)’으로 식물을 보다
심상용(미술사학 박사, 동덕여대교수)
몇 해 전 나는 김보희의 바다에서 쉼의 조건을 목격했었다. 그 쉼은 적어도 내겐 ‘영혼의 조건’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 바다의 수면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잔잔한 물결이 찰랑거렸던 김보희의 화면에 이번엔 녹색식물들이 무성하다. 바다가 수평의 세계였던 반면, 식물은 수직의 질서를 대변한다. 바다와 강의 고유함이 ‘흐름’이라면, 후자의 것은 ‘자람’이다. ‘흐름’과 ‘자람’은 하나의 거시적인 순환 안에서 하나로 만난다.
초록이 무성한 이 세계는 대지의 산물로서 생명감으로 충만하다. 그의 식물들은 신선한 수액을 빨아들이고, 온몸으로 햇볕에 반응한다. 그것들은 모두 ‘위’를 향해 자란다. 그 방향은 생명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줄기와 크고 작은 잎새들은 가장 고전적인 동시에 가장 전위적인 생명형태(life form)의 전형이다. 그 내면에선 녹색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수액은 녹즙이 되어 전신을 돌고 말초에까지 이른다. 대기는 그 생명의 체화를 촉진시킨다. 그것은 ‘생(生)’ 자체의 현현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도리가 없는 신비다! 식물들은 하나같이 경외로운 아름다움을 옷입고 있다. 그것은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 그것 하나보다 못 한 차림으로 지냈다”던 그런 옷이다. 그 생(生)으로부터 비롯되는 윤기는 오늘날 우리의 문명화된 도시와 메마른 현대적 삶이 걸칠 것을 권장하는 화려하게 치장된 회색의 망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생명이, 그 신비가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잘난 척 하는 문명이 아직 단 한 번도 그에 버금갈만한 온전함을 만들어낸 적이 없음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전에 김보희는 우리에게 강과 바다의 심오한 청색을 소개해 보여주었다. 그것은 청색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나무와 수풀과 잎사귀들의 초록이다. 약간 남색이 섞인 청록에서 투명한 담록에 이르기까지, 올리브 빛이 도는 것에서 에머럴드 톤의 것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녹색은 심지어 넓고 윤기나는 것과 비좁고 껄끄러운 잎의 표면까지, 그것들의 다채로운 피부조차 섬세하게 포착해낸다. 붓질은 담백하고 정직하며, 기교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작가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대신, 대면(對面)한다. 따듯하게 만나고 깊게 이해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르면, 이해는 그로 인해 “대상을 친밀하게 알고, 그 내부로 꿰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심층을 꿰뚫는 순수한 시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어떤 내밀한 차원에서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이해, 즉 대상과의 하나됨의 경험은 우리를 놀라운 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그것은 존 던(John Donne)의 다음과 같은 싯구에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인식이다.
“인류는 하나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니. 사람은 아무도 저 홀로 온전한 섬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 DNA에 대한 새로운 지식 덕에 우리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 놀라운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원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고 있다. “박쥐나 딱정벌레, 박테리아 할 것 없이 … 지구상 어디에 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똑같은 사전을 사용하고 똑같은 유전암호를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다."(메트 리들리,Matte Ridley)
화가는 유전공학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려 왔던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시선을 매개로 하는 깊은 이해로 대상의 내부 깊숙이 침투하고, 마음으로 만나는 그것으로 인해, 진지한 영혼을 소유한 화가의 시선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진실을 소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화가는 거대한 보편성 대신, 사물의 양태들 하나하나와 따듯하게 만남으로써 생명과 대면한다. 즉, 보편적 관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식물, 하나의 잎사귀를 그림으로써 가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점유하는 것이다.
“정말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경이를 느껴야할 대상은 -플라톤의 의미에서의-형상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25만개의 서로 다른 잎사귀이며, 본질적인 새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9천종의 새이고, 다른 모든 언어를 포괄하는 초(超)언어가 아니라 전 세게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6천 개의 언어이다.
김보희의 녹색의 세계는 우리를 이와 같은 사물과의 구체적인 대면으로 안내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대상과 곧 친밀해지고, ‘진정으로’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즉각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라는 뻔뻔스러운 가정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도 그 녹색의 생명체들만큼이나 성장과 쇠퇴의 법칙에서 면제되어 있지 못하다. 그것들처럼 우리도 현재는 빛나거니와, 하시라도 고갈되거나 메마르고 앙상해질 수 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은 자연의 하수인이 아닌 것만큼이나 주인 또한 아니다. 작가의 시선에 편승함으로써 초록에 대한 우리의 맹목(盲目)이 해소되고, 감각의 우둔함이 완화된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리는 큰 수고 없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누락하거나 간과하는 것들이 많은지를 자각하면서 말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물과의 접촉이 부재하고, 타인이 시야에서 사라지며, 아퀴나스적인 의미의 심오한 이해가 불구가 되어버린 마당에 이는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초현대적 삶은 점점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좀처럼 체계를 작동시키는 조건들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점차 품위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나이든 사람들은 지나치게 유행을 쫒고, 학생들은 자신이 세련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리 호이나키는 이들을 ‘특이하게도 현대적인 형태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죄 없는 양들’에 비유했다. 오늘날 미(美)에 관련된 사상들은 그것을 경영하는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심 속에서 매우 정교한 것이 되었지만, 삶과 거의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이러한 정교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것들은 서구 계몽주의의 달갑지 않은 유산인 오만의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자질과 무관한 것들이다.
품위란 어떤 유형화된 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존중하고, 겸양과 예의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절제하고, 품위없는 것이 되어가는 것은 무엇이 좋고, 나쁜 취미인지에 대한 감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보희의 식물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무뎌진 생의 정서와 품격을 전해준다. 이는 가르치려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의 만남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드는 태도들은 주제넘은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점검할 어떠한 기준도 부재한 상태에서 과거를 단죄하려드는 것이야말로 주제넘은 짓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러한 믿음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허영심은 우리시대의 전형적인 죄악이다.” 그러므로 다시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19세기의 랍비 삼손 라파엘 히르쉬(Samson Raphael Hirsch)가 ‘자연세계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말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여야 할 존중심을 마땅히 하등생물에게도, 이 모든 생명을 품에 안아 부양하는 땅에게도, 동식물 전부에게도 보여야 한다.”
즉, ‘두터운 맥락의 친밀성(Context-laden Intimacy)'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화가 김보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이다.